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인 니콜라 트뤼옹(Nicolas Truong)이 2021년 브뤼노 라투르와 나눈 대담을 기록하여 2022년 출판한 <브뤼노 라투르 마지막 대화>를 쉬엄쉬엄 읽고 있다. <브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를 옮긴 바 있는 이세진 번역가가 옮겼고 복복서가에서 2025년에 출판했다. 프랑스에서 정치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배세진 연세대 강사가 감수하고 해제를 덧붙였다. 프랑스어 제목은 <Habiter la terre>로 우리 말로 직역하면 ‘지구에 거주하기’다.
한국어 책 제목인 <마지막 대화>는 2022년 타계한 브뤼노 라투르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일테다. 브뤼노 라투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에 제목을 보고 무엇을 기대할까. 어차피 이 책을 읽을 사람은 브뤼노 라투르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라 본 것일까.
트뤼옹은 서문에서 2017년에 나온 <어디에 착륙할 것인가(Où atterir?)>(국내 제목은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와 2021년에 나온 <어디에 있는가?(Où suisje?)>에서야 라투르가 프랑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말한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그렇게 인식되어) 라투르의 정체를 종잡지 못했던 대중들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에 대한 라투르의 현명한 질문(어디에 착륙할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에 드디어 반응했다는 것일까. 이 책의 원 제목인 ‘지구에 거주하기’도 이러한 대중의 관심을 이어가는 것일테다. 대중을 꼬시기. 그런 점에서 한국 학술계에서 라투르가 소비되는 방식이나 이런 한국어 제목이 못내 아쉽다.
책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브뤼노 라투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떤 문장에 밑줄을 그을까. 한국어 번역본 제목에 대한 불만을 조금 줄여본다. 그래도 ‘임계지대’와 ‘가이아’, 내가 의존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자기기술), 집합체와 전시, 필수통과지점 등의 개념을 접하고 그 쓰임을 각자 상상하거나 사용해볼 수는 있다. 나는 브뤼노 라투르가 자신을 ‘존재 양식’을 사유하는 철학자로 규정했으며 생태계급과 같은 말은 철학자로서 모호한 것에 이름을 붙여 드러내는 작업이었다고 얘기하는 문장에도 밑줄을 그었다.
최근 책들보단 어렵지만 더 깊은 논의를 담고 있는, 라투르가 2004년 발표한 <자연의 정치학(Politiques de la nature)>과 이 책에 영향을 준 미셸 세르가 1990년에 발표한 <자연계약(Le Contract naturel)>도 번역되고, 라투르와 미셸 세르의 대담집인 <해명> 번역본도 재출간되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지적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도 라투르의 책 <Nous navons jamais ete modernes>를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옮긴다. 책 제목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장도 이렇게 옮긴다. 프랑스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We've never been modern‘이고 이는 ’우리는 결코 근대적이었던 적이 없다‘일 것이다. 십 수년 전에 블로그 이글루스를 사용할 때에도 이 책의 제목에 대해 비슷한 얘기를 했다. 라투르는 우리가 ’근대인‘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근대인‘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근대‘라는 모습대로 산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어를 공부하고 프랑스에서 공부한 역자들도 번역을 바꾸지 않은 것을 보면, 문법적으로 ’근대적‘이 아니라 ’근대인‘으로 옮기는 것도 타당한 것일까. 이런 단락들에서만 문맥이 살짝 꼬이는데, 그럴리가.
마지막 문단을 적어보자. 손자 릴로가 40년 후에 이 책을 읽는다는 가정 하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요청에 라투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끝을 맺는다.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것은 할아버지의 역할도, 철학자의 역할도 아닙니다. 한 20년간은 힘들겠지만 그다음 20년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유예된 문명화 과정을 재개할 방법을 찾게 될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40년 후에 릴로를 만나기로 한다면, 내가 근대의 괄호라고 부르는 기간 내내 우리가 처한 생태학적 상황에 대한 부인, 무지, 몰이해의 역사가 펼쳐졌음을 함께 보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 시대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치 지금 사람들이 13세기 교황주의 로마가톨릭을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묘한 종류의 형식이지만 당시에 대단히 중요했고, 그 시대에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기도 하지요. 이게 바로 내가 릴로에게 바라는 최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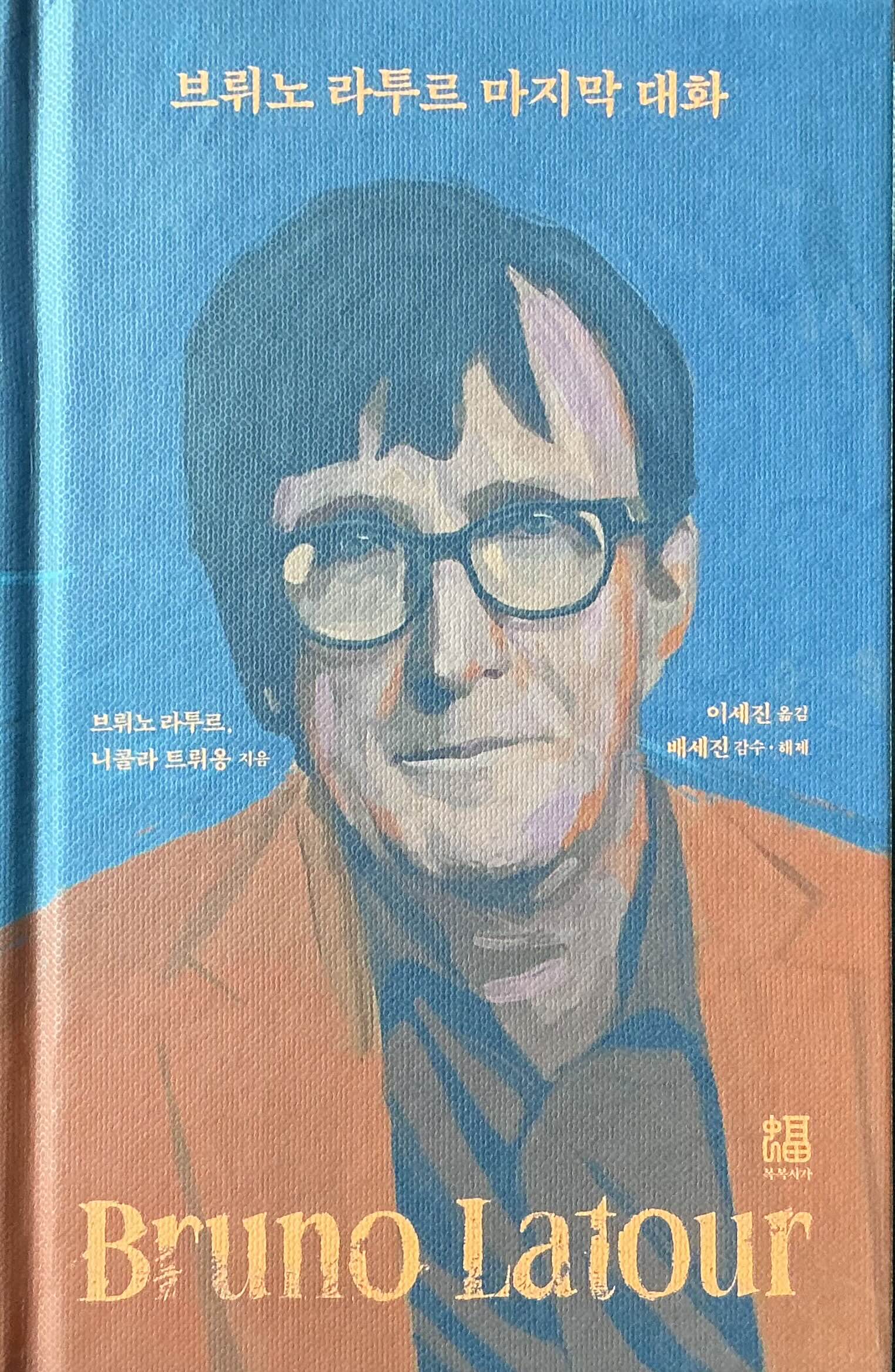
뒤에 실린 해제는, 흥미롭긴 하지만 배세진 강사의 학술적 작업에 관심이 큰 독자들이 아닌 바에야, 굳이 찾아 읽기를 권하지 않는다. 니콜라 트뤼옹은 감사의 글에서 ’이 텍스트가 대화의 구어적 성격을 간직하면서도 문학성의 요구를 지탱해야 한다는 영원한 고민에 부응‘한 로즈 비달의 수고에 감사를 표한다. 배세진 강사의 해제는 이 책의 ’구어적 성격‘과 잘 맞지 않는다. 트뤼옹의 서문을 다시 읽고 책읽기를 마치자. 그리고 서문에 소개된 이자벨 스탕거스나 미셸 세르의 책으로 이어가자. 보다 진지하게 라투르의 책 <존재 양식의 탐구>로 넘어갈 수도 있다.
'말과 글, 고르고 고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영신, <기후여행자> (0) | 2025.04.07 |
|---|---|
| 에릭 와이너, <천재의 지도> (0) | 2025.03.31 |
| 송성수, <한국의 산업화와 기술발전> (0) | 2025.03.12 |
| 마리아나 마추카토, <미션 이코노미> (0) | 2025.03.08 |
| 김재인, <AI 빅뱅: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 (1) | 2025.02.24 |



